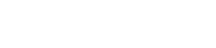한국 예술론
| 저자 | : 황의필 |
|---|---|
| 발행일 | : 2019-09-17 |
| ISBN-13 | : 979-11-87897-72-9 |
| 판형 | : 크라운판 |
| 페이지수 | : 360 쪽 |
| 판매가 | : 35,000 원 |
들어가는 글
이 글은 한국 예술 철학을 담으려는 의도에서 쓰인 한국 예술론(韓國 藝術論)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 화학(畵學)의 구조를 읽음으로써 예술 정신이나 사상으로 화맥(畵脈)의 세계를 품으려고 궁리한다.
이러한 구상에서 출발하여 본문은 화리(畵理)의 정신, 성격, 구조, 이치, 사상, 이법(理法) 등을 아무런 구애 없이 서로 호응 관계로 엮어나간다. 그런 탓에 관련 학문이나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동시에 특정 화파(畵派)나 화법(畵法), 화교(畵巧), 화상(畵像), 화식(畵式)의 구속이나 속박(束縛)당한 머뭄(住)에서 떠난 ‘치단(治斷, enlightenment)’의 논법으로 접근한다.
그런즉 이러한 탐구와 진단 그리고 모색의 예술론에서는 주체의 난립 때문에 유발하는 장애(障碍)를 무공(无空)으로 끌어안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이 때문에 정설(定說)이나 정법(定法)조차 무심(无心)으로 받아들이려고 시도한다. 이른바 무심은 파산할 그리고 격돌할 그 무엇도 발산하기를 꺼린다. 그런 만큼 융섭(融攝)과 융합(融合)으로 학예(學藝)의 순행 이치를 따르려는 화(和)의 섭리만이 무한히 맴돌고 또 맴돌 뿐이다.
이 글의 성격을 굳이 따지라면 한국 예술 철학의 성향이 깊다. 다만 여기에서는 한국 예술 철학의 안과 밖을 두루 살피어 인접 학문과 교환하는 장을 마련하려는 데 주어진다.
더불어 이 글은 한국 예술론과 관련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수한 통로로 걸어가는 학문과 예술의 물음을 동시에 얻으려는 방편이 짙게 깔린다. 이유인즉 상호 응대 관계에 따른 궁구의 길잡이로서 중도(中道)의 원리를 품으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구실로 한국 예술론의 탐구와 관심을 여타 학예와 중용의 입장에서 서로 나누길 바란다. 그 일환으로 예술에 담긴 수많은 맥(脈)의 현상을 그물망의 연접 관계와 연결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각 장마다 주제 배열은 선·후(先·後)가 무의미한 짜임새로 구성을 짓는다. 가령 총 39장에 따른 각 주제의 문맥 절차나 형식은 대체로 자유로운 서술을 이룬다. 더욱이 한자의 독음(讀音)과 훈독(訓讀)을 재음미함으로써 현대 예술 언어와 조금이나마 장벽을 해소하려는 필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각 장에 드러난 구성이나 내용을 대부분 간결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이유는 되도록 불필요한 언어를 등지려는 뜻이 담긴 탓이다. 더불어 그림과 이론이 서로 회통하는 입장을 예술 철학의 논법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화가의 정신이나 사상, 심상 그리고 작품에 담긴 암시와 제시, 분석 등 여러 측면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문 구성은 우선 필자가 창작한 원문을 예술론 구조의 토대로 삼는다. 이를 다시 직역(直譯)한 연후에 해의(解義)로서 해명과 해석을 곁들인다. 아울러 도식 첨가로 충분한 이해를 도우려고 꾀한다.
자고로 자연계·인간계·천지계 그 모두에는 언제나 서로 함께 호흡하면서 무한히 흐르는 ‘화(和)’의 논리를 잉태한다. 여기에는 이분화로 고착된 주체나 객체의 분파를 저버린다. 그러므로 상승이나 하강이 상호 교섭하는 이치를 이루듯 따로 나누어 분리할 리도 만무하다.
하지만 이를 주체자의 관념이나 생각으로만 쉽사리 판단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분산과 분파의 습성에 길들여질 위험이 뒤따른다. 혹시 이런 지경에 처한 국면이라면 관습이나 습성 그리고 속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새 염오(染汚)에 빠지거나 물들여진 탓이 크다.
이를테면 주체자가 오랜 세월 동안 집착이 쌓이면 순간순간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정작 그에게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 놓인다. 이럴 경우 아예 체념하거나 인식한 자체마저 망각하려고 무던히 애를 태울 법도 하다. 이처럼 벗어지거나 벗어나려는 인식의 틀에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집착이 자아(自我)를 저울질하기 마련이다.
그런즉 앎의 순간이 개입한 인식 상태에서는 대상이 서서히 자리잡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인식은 은밀하게 대상을 벗어던지려는 시도로 드러나는데,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아 발동이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자아 발동은 주체자의 인식이 개입한 상태에서 이미 그러한 근거마저 설정하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동시에 형성한다. 무릇 앎이 존재하기에 자아를 스스로 인식한 나머지 하나의 대상으로 확정하기에 이른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元曉, 617~686) 역시 집착과 인연을 단절하려고 고심하면서도 이 모두가 부질없다고 한평생 궁리하지 않았던가. 그가 강조하려던 우주 만물의 이치는 ‘화쟁(和諍)의 논법(和諍論理, Harmonization logic)’에서 이를 입증한다. 곧 ‘화쟁’은 서로서로 평등한 화합의 장으로써 논쟁을 해소하려는 섭리이다.
이에 따라 그의 저서 『이장의(二障義, Treatise about two klesa)』에서는 ‘출체상(出體相, 체상(svabhva-lakaa)을 나타냄)’, ‘변공능(辨功能, 공능을 분별함)’, ‘섭제문(攝諸門, 각각의 문이 포섭하고 있는 번뇌의 종류를 밝힘)’, ‘명치단(明治斷, 다스려 끊음을 밝힘),’ ‘총결택(總決擇, 총괄하여 결택함)’을 언급한다.
그런 이유로 끊임없이 구속당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이겨내기 힘든 고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를 스스로 다스리는 법을 무법으로 유유히 호흡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세상과 공생하는 평등을 이룰 성싶다. 그러므로 공생은 법과 무법을 제각각 나누는 존재로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법에서 떠난 무법 그리고 무법에서 떠난 법을 언어로서 그렇게 표현할 따름이다.
더 나아가서 주체자가 설정한 철저한 규제와 규약 그리고 규범은 오히려 예술을 창작 기능으로만 훈련시킨다. 여기에는 습관을 저장시키는 작위(作爲) 상황이 항시 뒤따른다. 그러므로 작위는 습관이 조정하는 반복 기능과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무리하게 쌓아가는 작위 행위는 자의의 결단에 따르므로 선명한 창작을 요구한다. 이럴 경우 정작 주체자가 품은 수많은 고뇌의 실마리는 해소하기 곤란하다. 이는 자아나 의식에 집착하는 소치여서 보고 보이는 정황이 동시에 상호 교섭으로 이루어지는 명경(明鏡) 현상을 스스로 잃는다. 이로써 규준이나 구획된 틀에 함입당하면 그러한 상황조차도 아예 망각해 버린다.
자고로 예술론이나 창작이 주체자의 특권이나 특정인의 소유물로 전락하면 곤란하다. 더더욱 철저한 주체 의식으로 말미암아 시각에만 의존하는 감상용을 예술의 전부로 치부해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만큼 일방으로 객체에 머물러 지시나 해석을 권장하는 주체 발동은 예술 창작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만약 이런 지경에 다다르면 주체가 개입한 이성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기 마련이다.
이른바 예술이 규제받는 형식과 양식 그리고 기법과 구조에 이끌리면 의식화로 짜인 각별한 기틀만 양산하는 원인을 낳는다. 그런 연유로 갇힌 사고나 매몰된 의식으로는 무진한 예술의 근본을 대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관이 개입한 고정화한 의식이나 규준화한 작위 구성을 창작 발동의 근본으로 숭배해서는 편협한 결과만 초래한다.
이를테면 무궁한 예술은 부유하는 구름이나 유유히 흘러가는 물결처럼 그저 그렇게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돈다. 그러니 보이면서도 보지 못하고 알면서도 알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느끼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무시공(无時空)’한 현상만 무한히 부유한다.
이에 ‘무시(无時)’를 두고 “때가 없다는 바는 일정한 때가 없이 항상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말하자면 ‘무시’의 의미는 무궁한 ‘무(无)’ 시간을 일컫는 셈이다. 그러므로 ‘무’의 예술은 그 어디에서도 무한한 비존재로 남는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는 예술은 예술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쓰일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예술을 예술이라고 틀 지워 주장할 소지도 불필요하다. 다만 예술은 인간 세상과 더불어 공유하면서 통섭(通攝, consilience)과 소통(疏通, mutual understanding or communication)의 입장에서 서로 단멸을 멀리할 뿐이다.
필경 예술의 정의나 정체성을 굳이 찾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막다른 길목에서 마냥 그대로 서성이는 지경에 놓인다. 이제 예술은 이장의(二障義)가 표방한 ‘화쟁’의 섭리처럼 공생(共生)과 융화(融和)로서 스스럼없이 회통(會通, mutual understanding of knowledge)하는 해탈의 도(道)에 다가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어쩌면 이러한 태도 자체만으로도 번뇌를 스스로 일으킬 여지는 충분히 남는다. 하지만 무규정으로서 찰나(刹那)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순행으로서 얽매인 결박을 떠나보내면 영구히 정신과 마음이 평온해질 법하다. 이처럼 예술에 다가서는 태도가 심온(深穩)한 경우라면 막힘없는 숨을 지속으로 호흡하는 바와 흡사한 형국을 맞아들이게 된다.
이 책이 전달하려는 한국 예술의 기저에 깔린 예혼(藝魂) 정신은 무규정으로서 상생(常生, mutual harmony) 섭리를 따른다. 이에 걸맞게 예혼은 실체의 존속이 공허한 일원(一元)으로써 생성과 소멸이 시작도 끝도 없이 교차하면서 서로 엮고 엮이는 ‘일심(一心, one mind)’의 청정(淸淨)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서 일심은 허공(虛空)이며 무상(无相)이며 비각(非覺)이며 무심(无心)이며 공공(空空)이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융화를 무한정으로 맞이한다.
결국 예혼의 섭리는 고정된 실체와는 다른 양상이어서 무궁무진(无窮无盡)한 회통의 이치를 품어낸다. 이른바 지속으로 쉼 없이 회통하는 순리는 잡으려고 애써도 잡지 못하므로 집착에서 아예 떠나버린다. 더욱이 고착된 존재에만 매달린 나머지 형상 구축을 유발하는 사고나 행위마저 꺼리니 천착된 도상(圖像)에 이끌릴 리도 만무하다. 그런 연유로 이분(二分)이 아예 잔존하지 못하여 나누어 분간 짓는 일이 무색하니 오직 ‘일원’으로 공유할 뿐이다.
응당 일원의 이치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식 그리고 지각 행위를 포착한 구상이 달아난 상태이다. 그런 만큼 작위한 의식에 휩싸인 대상이 완전히 묻혀버리면 비무(非无)한 무형(无刑)을 순순히 맞아들이게 된다.
이에 한국 예술론은 예술 철학 차원에서 예술 기학(氣學)이나 예술 도학(道學) 그리고 예술 정신이나 예술 사상을 또 다른 예혼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다가선다. 이로 말미암아 한민족이 추구하는 예혼은 이문(二門, the two aspects)에서 떠난 평등한 원리(the principles of equality)를 머금는다. 그런 만큼 인간과 자연, 의식과 무의식, 정신과 질료가 일원으로서 공명을 울리는 계기이길 바라 마지않을 뿐이다.
이 글은 필자가 한국 예술론의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려는 의도에서 마음으로 출발한 집필이다. 그러므로 이 글이 어느 특정한 예술관이나 논리로만 한정 짓기보다는 소통과 화합하는 장으로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무엇보다도 한국 예술론의 서술은 고금을 막론한 혼맥(魂脈)의 요청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둥근 씨앗이 굴러굴러 어디론가 무한히 확산하면서 발아하는 생리처럼 정형화된 격식이나 척도 그리고 규준틀을 저버리는 융화의 길로 동행하고자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예술론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상의 정신 세계를 ‘화쟁’의 예술 철학으로 품어낼 씨앗이기를 기대한다.
황의필
第一章 靈理
第二章 理禪境
第三章 理宇宙
第四章 一法界
第五章 風河生
第七章 風法
第八章 靈空
第九章 相縛
第十章 體相
第十一章 解脫
第十二章 靈巫
第十四章 由巫
第十五章 本巫
第十六章 生動
第十七章 脫法
第十八章 融合
第十九章 畵自然
第二十章 伏斷
第二十一章 无法
第二十二章 祭式
第二十三章 生命
第二十四章 運行
第二十五章 風感回通
第二十六章 用色
第二十七章 離顯形表
第二十八章 非生滅
第二十九章 巫精神
第三十章 鬼神
第三十一章 占卜
第三十二章 虛无
第三十三章 靈氣
第三十四章 无相觀
第三十五章 遷想
第三十六章 妙得
第三十七章 聲風
第三十八章 一元論
第三十九章 風巫畵
화리(畵理) 구성(構成)
1. 화리 원리(原理)
2.화리 구조(構造)
參考文獻……
1. 古文獻
2. 解題 文獻·其他